<
야광(Glow Job)>(2018)은
임철민 감독의 (공개된) 5번째 작품이다. <
프리즈마>(2013)에 이은 두 번째 장편영화이고, 1인 제작 작품이었던 전작들과는 다르게 소규모 스태프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프로젝트 <야광>’은 영화와 공연예술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2017년 12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ACC)의 ‘젊은 공연예술 창작자 인큐베이팅 SHOWCASE’에 선정되어 먼저 공연 형식으로 소개되었고, 영화는 2018년 8월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야광> 프로젝트의 출발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다. 하나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 잠이 들었던 개인적 체험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라져 가고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다. 잠이 들었다 깨어난 순간의 몽롱하고 기이한 느낌은 임철민의 영화 세계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티브다. <
골든 라이트>(2011)와 <프리즈마>도 바로 그 순간의 체험에서 비롯된 영화다. 차이가 있다면, 전작들에서의 그것이 잠에서 깨어나 마주한 창밖의 빛 체험이었다면, <야광>에서 그것은 영화관 스크린의 (명멸하는) 빛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전작들이 그 순간의 느낌을 영화를 통해 되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야광>은 처음부터 ‘영화관’ 또는 ‘영화적 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단지 개인적 체험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문화적 체험의 차원으로 그 질문을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에서 집단으로의 확장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로의 확장이기도 하다.

(이미 사라진) 파고다극장, 극동극장, 성동극장, 그리고 (이제 사라지게 될, 즉 아직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 바다극장 등은 6~90년대에 영화관이자 남성 성 소수자들의 ‘크루징 스팟(cruising spot)’으로 향유되었던 장소들이다. 남성 성 소수자들은 영화관이라는 공적 공간을 공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비도의 장소로 점유/전용했다(일종의 ‘스쾃 운동’). 디지털의 도래와 함께 그 남성 성 소수자 하위문화는 사라졌고, 그 문화의 물리적 토대였던 극장도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다(이제 그 문화 또는 커뮤니티는 인터넷과 미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공간으로 이동했다). <야광>은 이 사라진 장소와 문화의 흔적을 찾아 탐색하는 영화다. 그 과정은 ‘디지털 시대의 영화/영화관’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의 과정이기도 하다.
<야광>의 구체적 내용은 몇 마디 말로 요약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자기중심적 서사 구성의 욕망에 저항하는 영화이고, 쉬운 대답을 제시하기보다 기꺼이 실패 가능성을 무릅쓴 수행적 질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미완의 영화’ 또는 ‘과정으로서의 영화’인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는, 안이한 요약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듭 보면서 함께 그 질문을 수행할 파트너로 삼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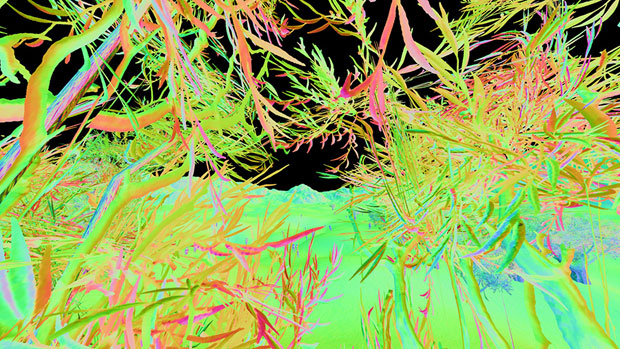
이 자리에서는 그 동참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콘텍스트 또는 정보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앞서 이야기한 이 프로젝트의 (식별 불가능하게 혼합된) 두 가지 계기이고, 둘째는 임철민의 영화 만들기가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다. 임철민은 먼저 계획(시나리오 또는 구성안)을 세우기는 하지만, 정작 영화 만들기를 시작하면 그 틀을 깨고 과정에서 마주친 우연적 요소들을 수용한다. 이 비우기와 채우기의 과정은 매우 직관적이지만, 최종적인 전체의 구성은 매우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리즈마>와 마찬가지로 <야광> 또한 매우 논리적인 3부 구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선택된 우연적 요소들과 논리적으로 배치된 3부 구성은, 매우 특이한(풍부하고 깊이 있는 질문으로 확장되는) 상징체계를 설립한다. 물론 이런 영화 만들기의 과정은 <야광> 또는 임철민만의 특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좋은 작품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야광>에서 특별한 것은 그 상징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론적으로 충전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가령, <야광>의 첫 쇼트에서 들리는 ‘빗물 소리’는 그냥 채집된 소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소리다. 임철민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과거 필름 시대 영화관 스크린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일종의, ‘시각적 노이즈’)을, ‘빗물 소리’라는 청각적 요소로 전환하여 현재로 옮겨 놓는다(이 빗물 소리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직접 제작한 ‘빗물 장치’를 통해 얻은 소리다. 그 빗물 장치는 앞서 말한 공연에서 매우 중요한 무대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렇듯 사라진 과거의 흔적을 현재의 물리적 현상으로 되살려낸 이 소리는, 앞서 말한 ‘극장-크루징 스팟’의 분위기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소였을 것이다. 이 현재화된 과거의 소리는 디지털 시대 남성 성 소수자 하위문화를 구성하는 다른 청각적 요소들(미팅 애플리케이션 알림음 소리, 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는 커버-댄스 문화를 제유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엔딩곡 ‘숨바꼭질’)과의 차이를 통해 일정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매우 의미론적으로 충전된 요소이다. 영화 <야광>은 이런 맥락에 대한 아무런 소개 없이 영화의 첫 부분에 던져 놓는다. 이 무심 또는 불친절은 <야광>을 또 다른 의미에서 ‘미완의 영화’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야광>은 ‘완결된 미학적 대상으로서의 작품’이라는 신화, 또는 ‘폐쇄된 극장에서만 진정으로 수행되는 영화적 체험’이라는 시네필의 신화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진정한 ‘포스트-시네마(영화이자 영화관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의 시네마)’라고 할 수 있다.